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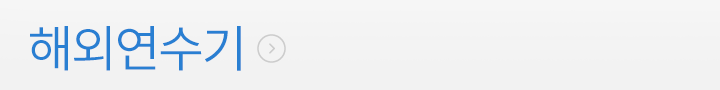


Stanford University 연수기
강신애(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Palo Alto에 있는 Stanford University의 Seung Kim 교수님 연구실로 2년간의 장기연구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연수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임상연구와 기초 연구 중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외국에서의 임상 연구는 나중에라도 단기 연수 등을 통해서 접할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2년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기 연수는 기초 연구에 투자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서의 실험 경력이 있었기에 연수지에서 실험 테크닉을 배워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따라서 연구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보았습니다. PI가 학문적인 discussion을 잘 해 주고 인품도 좋아서 대가에게서 연구면에서나 인생면에서나 많은 것을 배우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결론은 역시나 마음에 100% 쏙 드는 곳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수를 동갑내기 남편과 함께 초등학생 두 딸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는데, beta-cell & angiogenesis에 관심이 있었기에 beta-cell 연구를 하는 PI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를 모두 후보지로 두고 적당한 곳을 search 하였었고, 남편 역시 본인이 원하는 PI를 찾아서 동서부를 막론하고 contact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어느 정도 원하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Stanford 대학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anford 대학은 내분비 쪽 연구가 아주 활발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초청해주신 Seung Kim 교수는 지속적으로 beta-cell에 대한 좋은 paper를 내고 계셨고, 제가 가기 전까지 HHMI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가 갈 당시 HHMI가 연장이 안 되면서 잠시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RO1 그랜트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금방 다시 궤도에 오른, beta-cell 분야로는 아주 탄탄하게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올 해 초에 열린 islet biology keystone meeting의 organizer이기도 했습니다. Seung Kim 교수는 처음 e-mail 교신과 화상 인터뷰 후에 research proposal을 요구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주제로 2개 정도의 proposal을 작성해서 보내고 나서 final OK를 받은 것이 연수 출발 예정 3개월 전이었고, 마침내 2016년 2월 한국일을 허겁지겁 정리하고 Stanford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 1년 동안 실험실 생활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처음 Seung Kim 교수님과 시작했던 실험은 cloning부터 시작해서 lentivirus 제작, 그리고 genotyping을 거쳐 마우스 실험 및 human islet을 이용한 실험까지 진행되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proposal 했던 연구를 설득 설득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정도 data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기초 연구로 논문 1편을 온전히 쓰고 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연수를 떠나면서도 항상 고민이었던 것이 1) 랩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일에 잘 편승해서 논문에 이름이라도 어떻게 넣고 올지 2) 아니면 무엇인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돌아올지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product는 항상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연수가는 실험실 입장에서도 제가 잘 하던 것을 해주면 더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많이 끌렸지만, 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두 번째도 시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절반의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 교수님들의 말씀처럼 연수 기간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 가족간의 bonding이 강해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trouble 또한 없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얼굴 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기에 서로를 나름 고상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남편과 저는 ‘집안 살림’과 ‘아이들 픽업’이라는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로 서로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거비용이 제일 비싸다는 Palo Alto에서는 Nany나 House keeper의 고용은 고려 자체가 불가능했고,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보온 도시락에 밥을 담으면서, 그 옛날 어머니께서 자식 셋의 도시락을 챙기느라 새벽에 얼마나 고생하셨을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락 한 번 안 싸본 제가 미국에서 매일 보온도시락을 싸고 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동부와 다르게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학교 급식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물론 그 도시락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서양 아이들은 식빵에 잼과 버터를 발라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유독 Palo Alto에 있는 한국 visiting의 아이들은 엄마의 정성이 담뿍 담긴 도시락을 매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고기와 볶음밥을 얼마나 열심히 싸갔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 공립학교지만 학부모회가 나서서 사립학교처럼 donation을 요청하고는 해서, 안 그래도 비싼 물가에 고생하면서도 상당 금액의 donation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대강 듣고 가기는 했었으나 생각보다 너무나도 비싼 물가와 열악한 학교 재정에 당황스러웠지만, 실리콘 밸리에 있는 Palo Alto 특성상 학생들과 학부모들 community가 너무 나도 좋은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년간의 Palo Alto 생활 후 귀국하여 은행 잔고를 들여다 보니, 참 겁도 없이 신나게 지출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는 합니다.
저희 가족은 스탠포드 교수 및 직원들이 모여사는 Stanford West Apartment라는 multiplex에 살았고, 아이들은 학생의 50%가 Stanford 가족인 학교에 다녔습니다. 반 친구들 중에는 의대 교수들의 자녀들이 특히 많았는데, 같은 의사라는 동질감 덕분에 가족끼리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들여다 보게 되면서, 미국의 지도층 그룹은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전문직들은 한국보다 더 힘든 가사, 육아, 직업 환경에서도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play date를 가보면 상당 수의 엄마들이 lap top을 꺼내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불평이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연수 2년 동안의 가장 큰 소득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support하기가 버거웠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학원에 찌들어 지낼 아이들이 불쌍해서 남편과 저는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실리콘 밸리에 살고 있는 고학력 미국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이들 support 또한 정말 열심인 것이 하나의 자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축구 수영 등을 시작해서 일주일에 4-5일은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영 선수가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름 방학 동안 아침 7에 시작하는 2시간30분짜리 수영 연습을 매일 매일 흥겹게 갔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아직 늦잠을 자고 있을 아이를 여름 방학 내내 6시에 깨워서 차에 태우고 경치가 아름다움 280 고속도로를 달려서 foot hill college의 멋진 야외 수영장으로 ride 하던 것이 그립기도 합니다. ‘Hit the road!’ 하면서 딸들과 함께 신나게 차를 달리고는 했는데, 미국에서 먼 거리 여행을 갔던 것보다 딸들과의 그런 소소한 일상 생활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뵙는 선생님들마다 미국이 너무 그립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한국이 너무 좋다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연수기를 쓰면서 다시 돌이켜보니, Palo Alto에서의 하루 하루의 추억이 새롭고 그립지만, 그래도 현재의 제 자리가 더 좋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바로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큰 딸이 학교 적응을 못 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딸은 오히려 배시시 웃으면서 제 방에 와서는 ‘엄마, 한국이 너무 재미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이들 학원 뺑뺑이를 너무 안 돌려서 그런가, 노래방에 방탈출 까페를 다니는 자유학기제의 대한민국 중1이어서 그런가 여러 생각을 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우리 부부도 그리고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적응한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국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미국 생활 2년 동안 키도 훌쩍 컸고 생각도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신 교실과 병원의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년간의 연수 경험이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저를 지탱하는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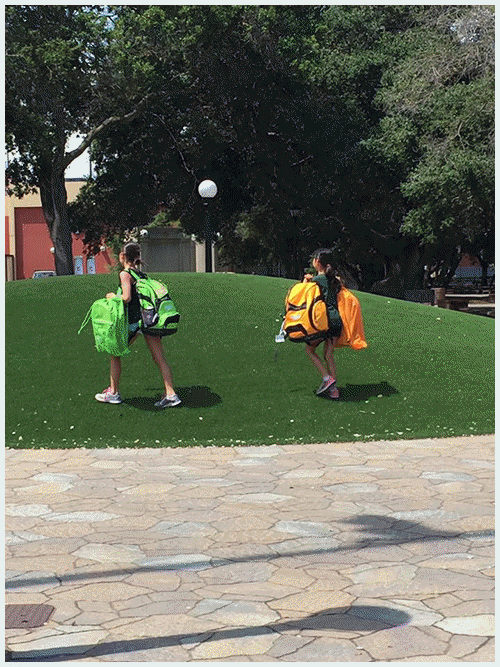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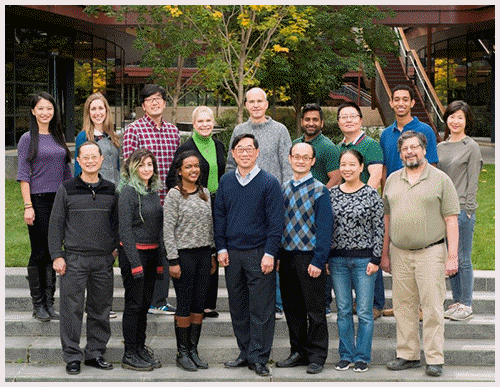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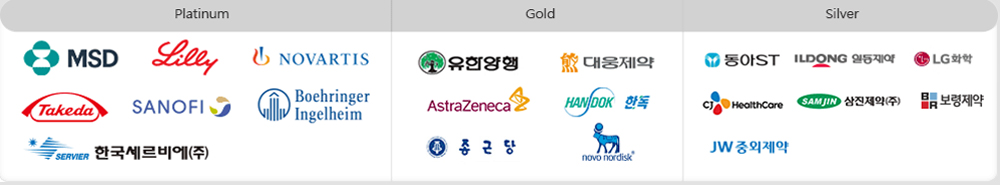

Copyright(c) Korean Endocrine Soci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