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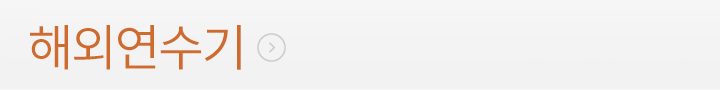


“Brave New World”
- My trip to the Wonderland
전성완(순천향의대 천안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지난 1년의 기억을 돌아보니 해외연수가 어마어마한 배움의 기회였음을 새삼 실감했다. 체득의 경험 하나하나에 나름의 감상을 얹을까도 했건만, 최신 연수기 10편 중 3편이 보스턴 소개인데다 같은 연구실 선배인 김상수 교수도 곧 연수기를 작성한다고 하니본고는 비슷한 하버드 이야기보다는 온 가족이 체험한 보스턴-브룩라인 생활을 다뤘다.
연수를 통해 가장 달라진 관점은 한민족 세계관에서 조롱의 대상이던 ‘천박한 미제국’의 장엄한 면모였다. 익숙했던 중화제국과의 대비는 여러모로 흥미로웠다. 미국을 한줌의 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장점이 부각된 보스턴으로 국한하면 대강의 묘사가 가능하겠다. 미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이곳 사람들도 그런 차별화를 싫어하지 않는 듯 했다.
보스턴에 오래 살았던 지인은 “First in Boston, Best in New York” 구호를 알려줬다. 백인 정착촌, 도서관, 미술관, 식당, 공원, 지하철 등 최초가 수도 없이 많다. 도저히 최초를 알 수 없는 역사 깊은 한반도 출신으론 귀찮을 수준이다. 그렇지만 교과서로 외우기만 했던 근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기록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부러운 마음도 컸다. 미래 문명의 발전도 보스턴에서 주도하겠다는 자부심을 여러 회의에서 느낄 수 있었다. 세미나 말미에 원로와 중견이 “There still be something unknown, WE must prepare for it.” 뉘앙스의 발언으로 팀을 독려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는데 의례적인 멘트로 치부할 수 없었다. 촘스키가 동네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노벨 학술상 수상자들이 강연하러 몰려오는 학술도시 보스턴에선 같은 말이라도 무게가 달랐다. 정착민의 안주를 경계하며 개척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일관된 진지함이 내비쳤다.
내분비학도의 관점에선 내분비계를 뛰어넘어 신경계, 면역계, 진화계통간 토론이 이미 활발했고, system biology 구축에 AI 접목을 시도하는 현장을 엿볼 수 있어 압도되었다. 대가의 발표를 듣다보면 마치 외계인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엄두도 못 낼 복잡한 주제를 조망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는 수준(허풍도 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으로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부럽기 짝이 없었다. 과학문명의 발전에 참여하고 싶은 한편, 도약 발판을 마련하는데 아직 과제가 산적함을 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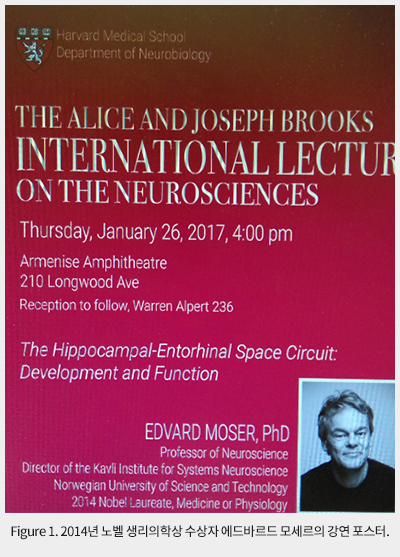
쇼핑과 여가 등의 일상생활도 예측,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립되어 사후반응 보다는 사전대비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체감하게 해주었다. 백년대계와도 같은 장대한 흐름을 타니 업무 집중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마치 꿈결 같았다. 다이나믹 코리아를 전투기에 비유하면 근대문명 300년의 미국은 항공모함 같은 안정감을 보여 주었다. 각자 여건이 다를 뿐 어느 한 쪽이 틀린 거라 할 수는 없겠으나 개성을 살리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되었다. 함께 근무했던 많은 nerd들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가며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다. 스포츠, 음악, 예술, 향락 문화는 놀랍도록 다채로워 여건따라 취향따라 일년 내내 즐길 수 있었다.
연수기간을 의과대학 학사일정에 맞추다보니 초등6년이던 아들의 학교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작년 7월 출국, 올해 6월 귀국하니 미국 서머스쿨도 한국 중학교 입학도 아쉬움이 남았다. 미국은 학사 규칙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한국에서 준비한 구상을 많이 조정해야 했다. 보스턴은 전세계 孟母들이 모이는 곳으로, 좋은 서머프로그램은 조건이 까다롭거나 너무 비싸서 남는 자리를 찾느라 고생했다. 대신, 동네 아이들과 만나보고 9월 신학기 시작 전에 미국식 교육과정을 선험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귀국 후 중학교 편입은 학교에 재량권이 많아 협조적인 중학교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학교가 편입을 싫어하면 제한장치를 많이 둘 수 있어 이른바 명문학교를 보내려면 확실히 불리하겠다.
미국의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찬사를 많이 듣고 갔는데 중학교 프로그램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미국 초등학교는 아이의 실수를 폭넓게 수용하지만 중학교는 사회 에티켓을 엄하게 훈련시켰다. 의외로 discipline 수위가 높았지만 대신 학생 보호에 철두철미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서 크게 만족했다. 브룩라인 교육청에서도 bullying에 대한 비밀조사를 쿼터마다 시행하면서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학군 내 다른 학교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소문이 있었음).
케네디의 모교인 Devotion school은 백인과 유대인 비율이 높았고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부모 그룹도 매우 성숙해서 부모로서, 세계인으로서, 교육자로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검소하게 갖추고 전통과 상대를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열심히 자아 실현하는 모범적인 가정을 온 동네에서 볼 수 있었다(과시자 및 실패자는 동네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함). 절제로 생긴 여유를 사회 환원, 약자 보호, 인재 후원에 활용하는 것도 목격했다. 멋진 공교육과 성숙한 지역사회 체험은 기대 이상의 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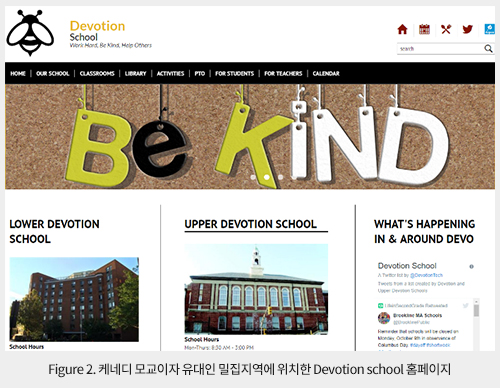
메이플라우어를 미국의 시작으로 여기는 백인 관점의 개척기도 도시 곳곳에 각인되어 있었다. 개별 일정으로 다녀온 케이프코드, 플리머스, 세일럼, 퀘백시티 여행은 개척의 흔적을 조각퍼즐처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외에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단풍, 찰스강의 카약, 와추셋의 스키, 화이트 마운틴의 코그레일, 탱글우드의 음악, 메인 주의 랍스터와 캠핑, 나이아가라의 버팔로윙, 천섬-오타와-몬트리올-퀘백시티 일주, 뉴욕-볼티모어-워싱턴 일주는 연구실 선배인 김상수 교수 덕분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다.

앞서 밝은 면을 부각했지만 어두운 면도 많았다. 수십년에 걸쳐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다른 규범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은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치안이 확실한 중산층 거주지역을 벗어나면 가족 안전부터 챙겨야 했다. 보행자 대 자동차처럼 뚜렷한 강자에 부여되는 엄격한 제한이나, 지위-인종-문명의 격차를 하대하지 않고 추켜세우는 화법이 처음엔 많이 어색했다. 첫 대면에 미소가 없으면 은근히 괴롭히는 하층민 문화도 알아채는데 오래 걸렸다. 향락 문화는 외지인 노출을 극히 꺼렸다. 그들의 “WE”는 작게 하버드 출신, 보스턴 출신, 동부출신, 미국주류(Anglo-Saxon, German, Jewish)였고 크게 봐도 미국출신, 백인계 정도로 국한하는 차별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느꼈다. 필연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는 ‘개척’은 최소화하고 심지어 도용을 정당화하며 주로 ‘숙련’만 높이는 동아시아의 스테레오타입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개심을 드러내곤 했다. 이런 yellow monkey의 악명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가져간 상황이지만, 백인의 혈통이 섞인 인도인에 대한 포용을 보고 있자면 동아시아인 견제와는 성격이 사뭇 달랐다.
명이든 암이든 진실되고 귀한 배움의 길을 열어준 병원과 대학, 대신 고생하신 김상진, 김여주 교수님과 짧은 일년이라는 기간을 알차게 채워준 김상수 교수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Copyright(c) Korean Endocrine Society. All rights reserved.